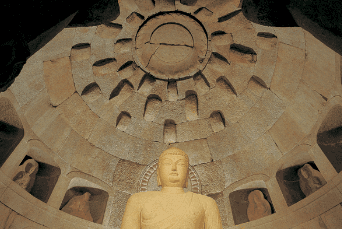『진짜 부처님을 오늘에사 보았네. 어쩌면 저렇게도 덕스러울꼬』
나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석굴암 기행문 중에서 가장 殊勝(수승)한 문장으로 알려져 자주 인용되는 趙芝薰(조지훈) 선생의 글을 아무리 음미해 보아도 뭔가 핵심이 빠진 듯 개운치 않던 뒷맛이 이제야 시원하게 가신 것이다. 할머니가 「진짜 부처님」이라고 한 것은 「가짜 부처님」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부처님」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들렸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눈앞의 佛像(불상)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다.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無情物(무정물)인 돌로 빚었다는 태생적 경계를 뛰어넘어 불상은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 생명력은 예술적 심미안과 역사학적 관심을 가지고 뜯어보려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머니들처럼 깊은 신앙심과 텅 빈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일체의 有情(유정)·無情物에 함께 존재하는 佛性(불성), 바로 그것일 터이다.
신라 불상의 완성된 형상, 그리고 한국 불상의 원형이 된 바로 그 불상을 마주하고 서서 내친 김에 우리나라의 부처님은 왜 저런 모습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만난 부처님의 형상은 달랐다. 아잔타의 29개 굴 속에 조성된 불상은 어디로 보나 키가 크고 얼굴이 길고 눈이 움푹 들어간 인도인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간다라 미술의 절충과 융합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불상은 실존하는 이 세상의 스승이 아니라 과장된 神像(신상)이었다. 그러한 부처님이 신라에 들어와 피가 흐르고 가슴이 따뜻한 인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불국사에서 동쪽으로 吐含山(토함산·745m)산등성이를 오르는 길은 두 갈래. 옛날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동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고 어둠을 헤치며 오르던 산길(3km)은 지금은 등산로가 되어 있고, 대신 자동차로 석굴암 앞 주차장에 이르는 석굴로(9km)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 이 길은 다시 해 뜨는 방향을 따라 동해의 문무왕 水中陵이 있는 감포, 양북 앞바다로 넘어가는 석장로로 이어진다. 경주 시내의 유적을 살펴보고 불국사를 지나 석굴암에서 일출을 본 후 곧장 동해 바다 속의 대왕암까지 이르도록 닦아 놓은 관광로다.
신라 五岳(오악) 중 하나로 東岳(동악)으로 불렸던 吐含山은 산 전체가 신라시대의 유적지로 가득 차 있어 소나무, 참나무로 뒤덮인 숲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마저 옛날의 향기를 품은 듯했다.
吐含山이라는 산 이름은 동해가 가까워 자주 안개가 끼기 때문에 마치 산이 안개를 머금었다가 뿜어내는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吐含山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것은 문외한이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바다 건너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수도 서라벌을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이다. 그 서쪽 자락에 불국사를 세우고, 동쪽 산등성이에 석굴을 조성했으며, 다시 석굴의 본존불이 반쯤 뜬 눈의 시선을 따라가 머무는 곳에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서원했던 문무왕의 水中陵이 파도를 견디며 누워 있다. 호국의 염원을 佛國土의 완성과 일치시켰던 신라인들 신앙의 실체를 이처럼 잘 그려 놓을 수가 없다.
「三國遺事」 권 5 「大城 孝二世父母」에는 『(大城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前生의 부모를 위해 石佛寺(석불사)를 세워 神林(신림), 表訓(표훈) 두 聖師(성사)를 청해서 각각 머물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金大城이 현세와 前生의 부모를 위하여 거창한 불사를 일으켜 불국사와 석굴암을 동시에 창건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어찌 이같은 일이 한 개인의 효도만이 그 동기이겠는가. 신라 사람들 전체의 염원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신라의 문화와 사회적 에너지가 응집되지 않고서야 어찌 이같은 大役事, 걸작품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불국사와 석굴암(당시 이름 석불사)이 창건되던 당시의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문화가 최고로 융성했던 시기인 만큼 융성한 신라 문화의 精髓(정수)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석굴암이라고 하겠다. 한 시대 정신의 정수가 응집될 때 거기서 세계적 걸작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석굴암은 참배객들이 부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입구의 前室(전실)과 전실에서 主室(주실)로 이어지는 통로에 해당하는 扉道(비도), 그리고 본존불을 안치한 원형의 主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짜여 있다.
집으로 말하자면 현관이나 거실에 해당하는 前室은 옆으로 퍼진 장방형으로 여러 차례의 重修(중수)를 통해 본래의 모습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다. 그러나 벽체의 모양은 중수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벽체를 구성하는 조각상들은 원래 모습 그대로다. 前室의 좌우 양쪽의 벽면에는 불법과 부처님의 권속을 보호하는 八部神衆(8부신중)이 각각 4구씩 배치되어 있다.
前室에서 비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악귀의 출입을 단호하게 거절하듯 金剛力士(금강역사)가 험악한 얼굴로 어귀를 지키고 서 있고, 비도의 좌우에는 지상의 중생들이 불법에 따라 바른 道를 행하며 살고 있는지 살피며 인도하는 사천왕이 좌우로 각각 2구씩 서 있다.
사천왕의 호위를 받으며 비도를 지나면 마침내 부처님의 세계인 원형의 석굴이 펼쳐진다. 석굴의 입구에는 비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돌기둥 두 개가 서 있고, 돌기둥 안쪽에 좌우 직경 6.84m, 전후 직경 6.58m의 둥근 방이 나타난다. 그 방의 약간 안쪽 편에 세계의 중심인 본존불이 연꽃 모양의 대좌에 안치되어 있다.
본존불이 안치되어 있는 대좌의 높이는 약 1.6m, 그 위에 태산 같은 무게로 좌정하고 있는 불상의 높이는 2.72m로 지척에 가서 보면 웅장한 규모이지만 前室의 위치에서 보면 참배객들이 가장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각도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 석굴암의 불상이야말로 부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일제시대 이후 여러 번에 걸쳐 重修를 하기 이전의 원래 모습에서는 주실 바닥 아래로 지하수가 흐르게 하여 바닥의 온도를 차게 함으로써 바닥에만 結露(결로)가 일어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실 내부의 벽면이나 불상들의 結露현상을 방지한 장치를 비롯, 천장에 채광창을 마련하여 빛과 온도의 자연 조절 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대좌와 석불, 前室과 비도 및 主室의 각도와 비례 등 완벽한 기하학적, 과학적 구도를 갖추어 신라인들의 과학적인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졸속한 重修 작업 과정에서 이러한 과학적 장치의 일부가 훼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 마디로 석굴암은 통일신라 융성기의 종교와 국방, 사회적 에너지와 과학, 예술의 총화라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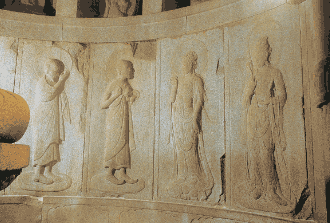
본존불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다. 석가모니불이라는 說과 아미타불이라는 說이 그것이다. 불신은 원래 한몸인데 무슨 부처이든 俗人들이야 알 바가 없다. 다만 참배하는 할머니의 말처럼 「진짜 부처님」 같은 생명력을 지니면 그만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너무 후덕해 보인다는 것이 다소 非현실적이어서 굳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었다.
본존불이 안치된 원형 석굴은 아래쪽에 10개의 돌로 벽체를 이루고, 그 위로 다시 약 2.42m 높이의 화강암 15개를 병렬시킨 후 화강암 하나마다 엷은 浮彫(부조)의 석상들을 조각해 놓았다.
본존불 바로 뒤편 중앙이 十一面觀音(11면 관음) 立像(입상)이고 그 좌우로 5구씩 十大弟子(10대 제자) 입상, 그리고 다시 그 좌우로 2구씩 천신과 보살상이 조각돼 있다.
11면 관음의 위쪽으로 10개의 龕室(감실)이 마련되어 있고 감실 안에는 문수, 유마, 지장 등 여러 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10개의 감실 중 8개에만 보살상이 안치돼 있고 2개의 감실은 비어 있다. 11면 관음보살상 앞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소형 5층석탑과 함께 일제시대 누군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어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눈을 들어 위를 보면 아치형으로 石材를 교묘하게 쌓아 만든 천장의 중앙에는 하나의 큰 돌로 만든 天蓋(천개)가 아름답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석굴암을 지을 때 1000개의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 것을 천신이 내려와 다시 붙여놓고 갔다고 한다. 그 세 조각으로 갈라진 균열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돼버린 석굴암을 찾는 발길은 평일에도 끊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석굴암의 훼손을 염려한 문화재청이 최근 모형석굴암을 현재의 석굴암 바로 근처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차라리 박물관에 세우는 것이 옳다. 석굴암 근처에는 자연을 훼손할지도 모르는 어떤 공사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쳐 주춤한 상태. 석굴암을 만든 선인의 후예답게 그 보존에도 지혜를 발휘해 주리라, 믿고싶은 마음이었다.●

 『진짜 부처님을 보았다』
『진짜 부처님을 보았다』